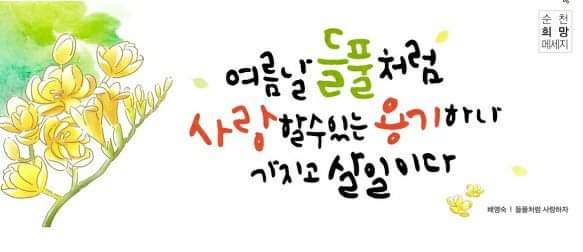그리움은 광목 커튼에 매달려
<가난한 서울>을 되돌아보며 본문
방학이라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유있게 아침을 시작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책도 읽고, 시낭송 연습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밀렸던(?) 수다도 떨고......
얼마만에 누려본 여유란 말인가?
그러나 너무 느슨해지니 글을 쓰는데는 많이 소홀해진 듯 하여 1997년에 문학평론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시를 읽어보며 재무장하고 있다.
좌파 기질이 강한 나는 그때도 사회운동(?)을 하던 젊은 시절이었으니......
< 가난한 서울 >
허름한 술집에 앉아
불지피던 욕정의 밤을 풀어놓고
훑어내린 연서에
스멀스멀 기어나온
피멍든 이름 하나
잘록한 허리에
땡글땡글한 엉덩이와 젖두덩이를
무기삼아
서울로 갔다
통속 잡지에 세를 얻어
박꽃 같은 밤을 보내더니
세월 넘긴 가난만
함지박에 가득
고향으로 가져왔다.
문학평론가 이수화교수는 감히 김지하의 <서울길>과 비교하며 평론을 하였다.
<서울길>
-김지하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머
팍팍한 서울길
몸 팔러 간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댕기 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중략)
울지마라 간다
하늘도 시름 겨운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 팔러 간다.
눈치 빠른 독자는 김지하의 시 <서울길>과 배영숙의 시 <가난한 서울>이 왜 대비적으로 인용되어 있는가를 간파하였을 터이다. 인용자의 의도는 아시다시피 뻔하다.
두 텍스트가 어쩌면 저다지도 일란성 쌍생아를 빼어 닮았느냐일 터이다. 물론 <서울길>이 <가난한 서울>보다 27년이나 앞서 출세한 작품이므로 일란성 쌍생아이기는 해도 <가난한 서울>에게는 부모뻘인 셈이다. 그러나, 그렇드라도 <서울길>의 화자가 서울로 몸팔러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시제이고, <가난한 서울>의 시제가 과거형이니까 두 텍스트의 변별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난한 서울>은 <서울길>의 후일담인 셈이다. 27년전 '팍팍한 서울길 몸 팔러 간' 텍스트 <서울길>의 주인공은 그 27년 후 '땡글땡글한 엉덩이와 젖두덩이를 무기삼아 서울로 갔다'가 '세월 넘긴 가난만 함지박에 가득 고향으로 가져왔다'는 (가난한 서울길)의 얘기인 것이다.
두 텍스트의 세계 인식이 동일한 파토스적 인식론이라면 두 시의 미학은 우리에게 비장감을 자아내 주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두 텍스트의 내포(Connotation)가 거느리고 있는 역사성을 비교, 감지함으로써 '서울'이란 우리의 현실 공간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에 보다 냉엄한 자각이 수반되었으면 한다. 두 텍스트의 작품성의 완성도야 차치하고라도 저러한 냉엄한 독자의 자각을 위해서도 저들 텍스트는 충분히 그 작품성이 뛰어나다.
시를 쓸 때는 이 시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시와 전혀 연관성은 없었는데 평론을 읽고나니 짜 맞춘 것처럼 비슷했다.
명지대 이수화교수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난 후에야 유명한 평론가라는 것을 알았던 때니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일이다.
가난한 시골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서울로 떠난 친구들이 돈을 벌어서 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병만 얻어온 상황을 시로 표현한 것이었는데 그 때 그 친구들은 모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자, 다시 초심으로 글을 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