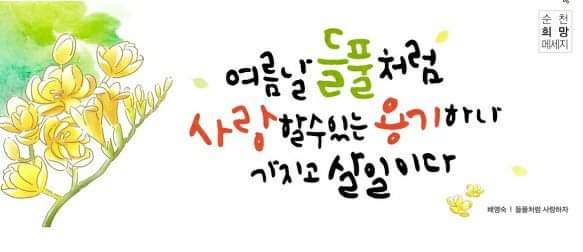그리움은 광목 커튼에 매달려
프랑스조곡(이렌 네미로프스키 작품)을 읽고 본문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렌 네미로프스키의 장편 소설 [프랑스조곡]을 선물 받았다.
생경스런 작가의 이름이나 책의 두께가 예사롭지 않아서 바쁜 3월에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화려한 수식어에 2004년 르노도 문학상 수상작이란 닉네임을 달고 있어도 쉬이 눈길이 가지 않았다. 학기 초라 애먼 일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렌 네미로프스키(Irene Nemirovsky)는 1903년 우크라이나 유대인 출신이다.
[데이빗 골더], [무도회]로 화려하게 프랑스 문학계에 데뷔하지만 1940년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한 후 모르방 지방의 한 마을에서 피난해 지내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어 1942년 여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살해되었다. 그 당시 13살이던 큰 딸 드니즈가 엄마의 원고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62년 후인 2004년 출간된 유고 소설집이다.
제 1부 <6월의 폭풍>에서는 피난길에서 만난 인간의 군상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가진 자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비굴하게 때로는 파렴치한 일들을 두려움 없이 해내고, 못 가진 자들은 기존의 질서가 붕괴된 틈을 타서 혁명을 꿈꾸기도 하고, 가진 자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은행 하급직원인 미쇼 부부만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가진 자들의 부패상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발자국 소리도,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손수레의 삐걱거림, 비둘기의 구구거림, 시골을 채우는 모든 소음들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버림을 받은 마을은 새, 벌 그리고 무늬말벌들의 왕국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기술한 대목에서는 피난을 가고 난 쓸쓸한 프랑스의 시골 마을을 그려볼 수 있었으며, 그 때의 황량함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감정을 유발하였다.
제 2부 <돌체>에서는 시골로 들어온 전쟁사를 그려내고 있다.
공포와 증오의 대상인 침략자 독일군이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전쟁의 희생자이기도 하면서 시골 마을의 사람들과 어쩔 수 없는 동거를 해야하는 생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사의 질곡이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한다.
뤼실과 장-마리의 고백하지 못한 사랑, 르쉴과 독일군 장교인 브루노의 사랑은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움이며 슬픔이었다.
특히 독일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서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르쉴은 브루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며 '전쟁터는 위험하기 짝이 없으니 부디 신중하게 처신하라'로 부탁한 중국의 엄마처럼, 저 역시 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한 목숨을 아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에 "제 목숨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습니까?"라며 차마 다하지 못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전쟁터의 애틋함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특히 적과 적이 되어 나누는 사랑에 얼마나 큰 아픔이 수반되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리었다.
더구나 또 다른 전쟁을 치루기 위하여 러시아로 떠나는 독일군들은 프랑스인들과 나누었던 우정, 그리고 전쟁에 대한 상념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어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을 것인데, 목숨같은 사랑과의 이별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마음을 알기에 묵묵히 부르노를 보내주는 르쉴.
종전이 되어 이루어지는 사랑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기약없는 그들의 이별이 비단 그들만의 일일까 ?
책을 읽는 내내 책속에서 꿈틀거리는 다양한 인간상이 괴롭혀왔다.
필립 페리캉 신부의 "Pater amat vos(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로 고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지만 전쟁 중의 배고픔과 약탈 그리고 탐욕을 허락하지 않는 신부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아이들. 결국 한 쪽 눈에 돌이 박힌 채로 물 속에서 죽어가는 필립.
아들의 죽음을 볼모로 본인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페리캉 부인. 아들 위베르의 자원 입대 그리고 위베르의 생활 등...
어느 것 하나 전쟁이 몰고온 것에서 비껴 설 수 없지만 가슴 저 밑바닥에서 끈끈한 액체로 머무르는 언어들.
르 푸엥(Le Point)은 " 이 소설을 펼치는 것은 잊고 싶은 기억들이 담겨 있는 요술 램프를 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렌 네미로프스키가 역사의 수렁에 빠진 유대인의 수기가 아니라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후세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대서사시로 보아 주는 것이 더 옳은 것은 아닐런지....
책을 읽는 내내 제3자가 되어 전쟁을 관찰하고 있을 뿐 내가 전쟁 속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럴 생각 또한 추호도 없다.
다만 그녀가 쓴 역사소설이 소설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로운 영혼을 구가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구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또 꺼내서 읽어봐야 할 책이다.
어릴 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고 줄거리를 헤맨 것처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읽다보니 온전히 내 것이 되지를 못했다.
[프랑스조곡]이라는 책이 숙제가 되어 오랜 시간 책꽂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하며....
'책과 영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언제였던가?(공지영) (0) | 2006.04.14 |
|---|---|
| 내게 교사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파커 J. 파머의 작품) (0) | 2006.04.06 |
| 황진이와 놈이의 비극적인 사랑(홍석중의 황진이) (0) | 2006.01.31 |
| 지나치게 아름다운 게이 로맨스 (0) | 2006.01.21 |
| 철 이른 [철쭉제]를 기다리며(문순태의 철쭉제) (0) | 200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