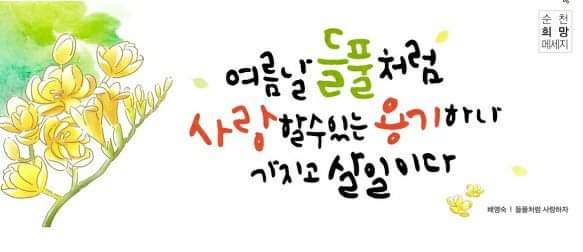그리움은 광목 커튼에 매달려
미래가 불안한 청소년들 본문
사회학자들은 자살의 종류를 이렇게 나눈다. 개인주의가 고도로 진전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기적 자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자살,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거부된 이들의 숙명론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성 자살이 그것이다. 아노미성 자살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저질러진다. 청소년 자살은 대개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기엔 자신을 통제하고 규율할 수 있을 만큼 자아가 성숙되지 않아,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한다. 의존성과 독립심이 갈등하고, 가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적응하지 못해 불안감과 혼란에 시달린다. 게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과 고통을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이 자살이다. 사회학이건 심리학이건 자살 동기를 먼저 사회구조나 인간관계에서 찾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청소년 10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그만큼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다. ‘시도’일 뿐이다. 문제는 자살 시도의 급격한 증가세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현실은 절망스럽고 미래는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5년 4.8%였던 것이 1년 만에 5.5%로 늘었다. 증가율로 치면 15%에 가깝다.
원인은 먼데 있지 않다. 우리만큼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나라는 없다. 초등생 때부터 사회는 가까운 친구들과 경쟁하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친다. 중·고교를 거치면서 이미 아이들은 선택되거나 낙오한다. 숨막히는 경쟁은 대학과 직장으로 이어진다. 끝없는 고통과 불안 앞에서, 왜 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사람의 자존감과 행복은 공동체적 유대와 사랑에서 나온다. 이기적 욕구가 아니라 이타적 사랑이 개인과 사회의 평화를 증진시킨다. 기성세대가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는 건 이런 가치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효율성의 미신에 사로잡힌 어른들은 더 가혹한 경쟁체제를 아이들에게 강요한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요구는 그 좋은 실례다. 절망한 아이들은 자살 시도로만 항변하지 않는다. 범죄로써 보복하기도 한다.
2007. 3. 30 한겨레 신문의 사설
'마실 나온 타인의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 작가 박경리 타계 (0) | 2008.05.06 |
|---|---|
| 까미유끌로델의 자취가 남아있는 '생루이섬' (0) | 2007.09.09 |
|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꽃들의 혁명 (0) | 2007.03.18 |
| 봄이 오는 소리 (0) | 2007.03.12 |
| 노인이라고 원초적 본능이 없나? (0) | 2006.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