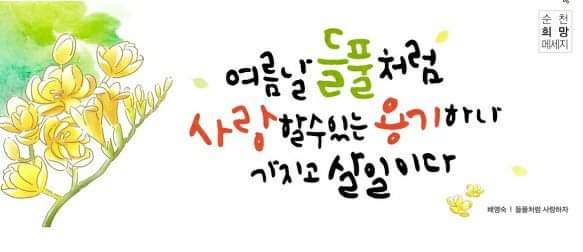그리움은 광목 커튼에 매달려
장애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허브).... 본문
그 잎에서 나는 향기때문에 영화를 만나기 전부터 설레었다.
동화속 주인공들이 영화의 서막을 알리고, 영화의 주인공들이 초반부터 강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엄마(배종옥)와 정신지체 3급인 딸(강혜정), 그리고 교통의경(정경호)이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일을 정상인의 시각보다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동화되고, 소통하는 가에 초점을 둔 영화다.
정신지체인 딸을 키우는 어미의 마음은 대부분 유사하리라.
가슴이 걱정과 연민으로 가득차서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까라며 노심초사하는.....
그러나 허브에서의 어머니는 가슴 한 귀퉁이에 걱정을 숨기며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며 교육시킨다. 누군가 '바보'라고 하면 바로 물어버리라고 정당방위를 가르치고, 그 딸은 성실히 그것을 이행한다.
삶이란 원하는 대로 정도를 걷기란 힘든 법.
나이는 스물이지만 7살의 정신연령에 머물러 있는 딸은 순수하지만 어른들의 걱정거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사고 뭉치다.
어느날 포돌이 복장으로 변신한 종범이 어린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를 왕자로 받아들이는 차상은, 정신지체 3급인줄 모르고, 청순하고 가련한 외모에 이끌려 자석처럼 그를 좇는 종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서 넘어졌던 상은의 가방에서 나온 정신지체 3급의 복지카드.
그녀는 자랑스럽게 복지카드를 내밀며 대접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종범은 그제서야 그녀의 동화같은 행동을 알게되며 실망한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 허브 향을 내며 들어와 앉은 수줍은 사랑.
종범과 상은 엄마의 대면은 투쟁적이며 반목적이다.
어쩌면 우리 일상과 너무 흡사한 만남.
억척스런 꽃집 아줌마와 교통 경찰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세세한 파노라마는 아닐런지....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통해 나오는 종범의 모습에 가슴앓이하는 상은,
그것이 사랑인줄 모르고, 가슴에 무언가 비어서 밥으로 그 가슴을 채우려는 상은의 모습.
암 말기를 선고 받고 남겨질 딸을 위해 연도별로 상자에 딸의 필요 용품을 차곡차곡 담는 엄마의 손길.
무엇 하나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화면 속의 주인공들.
탄탄한 연기력까지 뒷받침되어 영화를 보는 내내 차상은이 되었다가 그의 어미가 되어서 스크린을 채웠다.
남겨질 딸 아이에게 보태질 이별의 수순이 걱정되어 종범에게 헤어지라고 종용하는 어머니.
"오빠! 나는 몸은 컸는데, 아직 머리는 덜 컸대요. 다음에 머리가 커지면 그때 우리 만나요"라며 이별을 통보하는 상은.
꼴통끼리는 통하는 것이 있다고 했던가?
둘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뒷 이야기를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으니....
얼마남지 않는 엄마의 죽음을 알고, 소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꽉 찬 허브밭으로 향하지만 가는 길에 엄마의 죽음을 맞이한다.
허브 밭에서 독백으로 쏟아놓은 상은의 말.
" 엄마! 영란이처럼 똑똑한 아이의 엄마가 아니어서 좋고, 이쁜 엄마여서 좋고, 상은이 엄마여서 좋았어요."라며 절규하는 딸의 모습은 침잠되어 있는 모성에 불을 지피었다.
장애인이 정상인처럼 생활하기란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그럴 수 없을거라는 것은 정상인들의 오만이다.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소통하는 법을 잔잔히 일러주는 경고의 메시지도 묻어나온 이 영화는 '말아톤'처럼 실화를 주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인 가공(픽션) 또한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과제였다.
상은이의 직업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며 허브연을 만들어 띄우는 종범이의 따뜻한 마음도 영화의 대미를 작성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언제라도 차상은이 될 수 있는 우리들.
사고는 늘 우리들 주변에 산재되어 있다.
가족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회의 이중적인 잣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준 '허브'
오랜만에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영화에 그저 행복할 뿐이다.
'책과 영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존 헐) (0) | 2007.05.02 |
|---|---|
| 수업을 왜 하지?(서근원 작) (0) | 2007.04.29 |
|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두 번 결혼할 수 있을까?(박현욱의 작품) (0) | 2006.12.07 |
| 나의 生은 어떤 빛깔일까? (에밀 아자르의 작품) (0) | 2006.12.02 |
|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무하마드 유누스) (0) | 200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