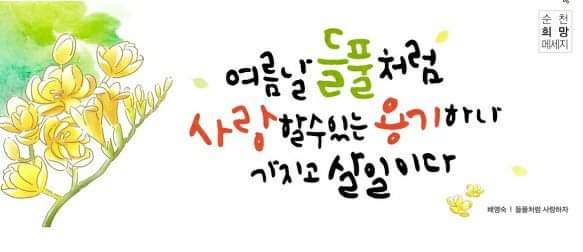그리움은 광목 커튼에 매달려
슬픈 사랑 [미인도]를 보고 본문
상상의 즐거움이랄까?
역사적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빛깔의 사랑일까를 궁금해하며 전윤수 감독의 [미인도]를 보았다.
김홍도와 신윤복.
동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화가들의 삶과 예술적인 면이 어떻게 조화되어 나올까?
스크린으로 빨려들어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홍도의 <서당> 김홍도의 <밭갈이>
김홍도(1745-1806)는 정조의 총애를 받을만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출세한 화가이고, 신윤복(1758-?)은 속화를 즐겨그려 쫓겨났다는 기록 외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는 인물이다.
김홍도보다 13살이 적은 신윤복에게 초점이 맞춰진 영화라 다분히 여성적인 면이 많다.
과연 김홍도와 신윤복은 애틋한 사랑을 나눴을까?
신윤복이 화원 가문인 신한평의 장남이라고만 알려졌지 젠더의 특성이 강했다라는 기록이 없으나 추측이 사실인 것인양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웠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넘지 못할 벽인줄 알고 있는 김홍도와 신윤복.
그리고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생 설화와 강무.
얼키고 설킨 사랑의 감정이 긴장감을 더했으며, 청나라의 다양한 체위 시범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감정이고 격정적이었다.
신윤복은 왜 그렇게 속화에 몰두했을까?
남존여비사상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나 양반들의 이중적인 삶, 그리고 여인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적나라하면서 비판적으로 화폭에 담아낸 이유는 사회를 향한 절규는 아니었을까?
특히 그림에 짤막한 글을 담아 냈던 신윤복의 글솜씨 또한 뛰어났음을 알 수 있고, 에로티시즘적인 인간 본성을 여과없이 드러내어 그 시대에 파격적인 그림이라 입방아에 자주 오르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 같다.

왼족의 그림은 달빛 아래서 남녀가 안타까운 정을 나누는 <월하정인>이고, 오른쪽 그림은 과부가 새와 개의 짝짓기 장면을 보고 웃는 모습을 그린 <이부탐춘>이다. 누가 저렇게 여인네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신윤복을 여자 또는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각각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복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짐작으로만 영화를 느껴야한 답답함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김홍도 역을 맡은 김영호의 중후한 연기, 김민선의 파격적인 올 누드, 요염한 자태를 가진 기생 설화역의 추자현, 도톰한 입술이 매력적인 강무 역의 김남길 그리고 여성들의 반 전라 모습이 아름다운 영상과 더불어 영화를 보는 재미를 주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엔 연인들끼리 따뜻한 마음 데우며 극장 데이트를 해도 좋을 것 같은 하루다.
'책과 영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0) | 2008.12.06 |
|---|---|
| 구해줘(Sauve-moi)를 읽고 (0) | 2008.11.30 |
| 위험한 독서(김경욱 작)를 만나다. (0) | 2008.11.05 |
| 냉장고에서 연애를 꺼내다(박주영 작) (0) | 2008.10.10 |
| 박사가 사랑한 수식(오가와 요코) (0) | 2008.10.06 |